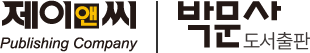도서소개
총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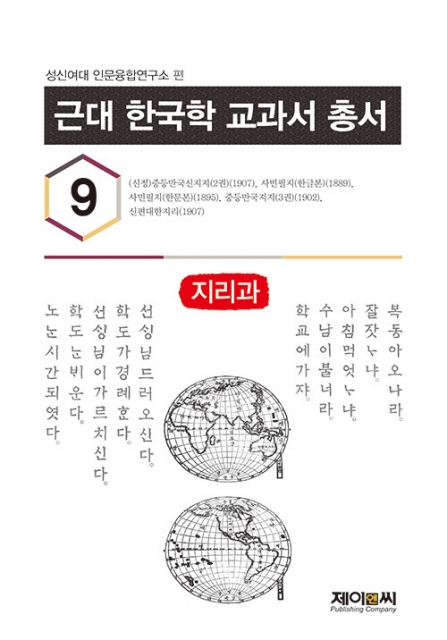
근대 한국학 교과서 총서 9: 지리과
저자 성신여대 인문융합연구소 정가 48000원
상세정보
근대 교과서는 당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ㆍ역사ㆍ정치ㆍ문화의 상황과 조건들의 필요에서 나온 시대의 산물이다. 한국 근대사는 반봉건과 반외세 투쟁 속에서 자주적인 변혁을 이루어야 했던 시기였고, 특히 1860년대부터 1910년에 이르는 시간은 반봉건ㆍ반외세 투쟁을 전개하면서 근대적 주체를 형성해야 했던 때였다. 주체의 형성은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 바, 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 근대 교육이다.
〈근대 한국학 교과서 총서〉에는 총 54종 133권이 수록되었다. 여기서 교과서를 국어과, 수신과, 역사과, 지리과로 나누어 배치한 것은 다분히 편의적인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교과(敎科)가 분화되기 이전에 간행된 관계로 개화기 교과서는 통합교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국어와 수신 교과서는 내용이 중복되어 분간이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교과를 나눈 것은 다음과 같은 최소 기준에 의한 것이다.
‘지리과’는 ‘지리(地理), 지지(地誌)’ 등의 제명을 갖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리과 교과서 역시 발행 주체에 따라 학부 간행과 민간 선각에 의한 사찬 교과서로 구분된다. 학부 교과서는 종류와 승인ㆍ보급된 수량이 적고 특히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식민치하에서는 발행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1895년 학부 간행의『조선지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 교과서로,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한 뒤, 한성부에서 경성부에 이르는 전국의 23부를 원장부전답ㆍ인호ㆍ명승ㆍ토산ㆍ인물 등으로 구분ㆍ기재하였다. 반면에 민간 선각들에 의한 발행은 일본의 교육 식민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간행된 다양한 특성의 교과서들이다.
본서의 명칭을 〈근대 한국학 교과서〉라 칭한 것은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교과서를 묶기에 적합한 말이 ‘한국학(Koreanology)’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한국학이란 범박하게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고유의 것을 연구ㆍ계발하는 학문이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언어,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를 망라하지만, 여기서는 국어, 역사, 지리, 윤리로 교과를 제한하였다. 이들 교과가 근대적 주체(한국적 주체)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그것이 이후의 복잡한 사회ㆍ역사ㆍ정치ㆍ문화의 상황과 길항하면서 오늘의 주체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 간행사 근대 교과서의 탄생
일러두기
신정 중등만국신지지 권1
신정 중등만국신지지 권2
사민필지(한글본)
사민필지(한문본)
중등 만국지지 권1
중등 만국지지 권2
중등 만국지지 권3
신편 대한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