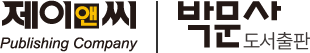도서소개
국어국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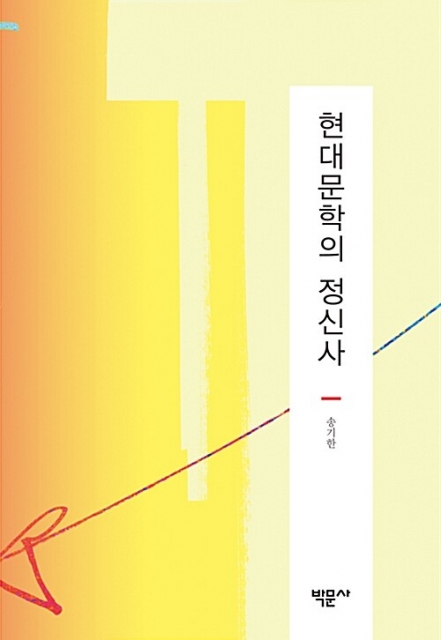
현대문학의 정신사
저자 송기한 정가 26000원
상세정보
현대문학이 정착한 지도 꽤나 오랜 세월이 되었다. 그런데 현대문학이라 할 경우, 현대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모던(modern)을 두고 우리는 근대라고도 하고 현대라고도 번역하지만, 서구의 경우는 근대 이후의 세계를 그냥 모던으로 부른다.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변곡점인 1945년 광복을 전후하여 근대와 현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화된 정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어떤 마땅한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정치적 사건이 그 중심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서구의 경우처럼, 근대와 현대를 따로 구분하는 논리가 허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서구에서 흔히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봉건시대, 곧 프리모던(pre-modern)과 구분하여 모던이라 명명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한국의 현대사가 굴곡진 흐름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누구나 이 시기를 현대성 내지 근대성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해왔음에도 뚜렷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없다. 또 그러한 일들만으로도 벅찬 마당에 일제 강점기라는 하중을 또다시 지고 있어야 하니 이 시대란 실로 불행의 연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라고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이어진 군사독재, 그 대항담론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 현대 문학에서 제대로 된 정신사가 전개될 수 없었음은 모두 이런 배경 속에 그 원인이 있었다.
정신사는 사상사의 범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초월하는 곳에 정신사의 영역이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상이 주로 외부와의 관계망 속에서 강력한 자장을 발휘하는 것이지만, 정신사는 그러한 영역을 포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신사는 개인의 범주나 문학사의 범주에서,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사라는 말보다 정신사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이로써 해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제1장] 김소월시의 자연과 반근대성 연구
1. 소월 연구의 현주소
2. 『시혼』과 반근대성
3. 근대적 자의식과 그 초월의 양상들
4. 근대성의 새로운 실험
[제2장] 임화 시의 변모 양상 -계급모순에서 민족모순으로
1. 임화 초기 시의 저변
2. 다양한 실험, 자기모색, 그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
3. 계급모순과 대결의식
4. 계급모순에서 민족모순으로
5. 해방공간과 민족모순, 그리고 인민성
6. 에필로그
[제3장] 이미지즘과 육사의 상관관계
1. 육사론의 행방
2. 이미지즘과 현실, 그리고 육사시의 출발
3. 현실에 대한 시적 응전의 계기
4. 구체적 일상에서 표명되는 ‘손님’의 표상과 ‘초인’의식
5. 이미지와 사상의 결합이 갖는 시사적 의의
[제4장] 이용악 시에 나타난 민족의식 연구
1. 이용악 시의 다양성
2. 자아의 각성과 존재론적 변이
3. 민족의 발견과 그 모순으로서의 유이민 의식
4. 귀향과 민족에 대한 새로운 발견
5. 민족모순의 시사적 의의
[제5장] 윤동주 시의 기독교 의식과 천체 미학의 의미 연구
1. 윤동주와 기독교, 그리고 문학
2. 원죄와 속박, 그리고 자의식의 형성
3. 속죄양 의식의 세 가지 형식
4. 재생과 부활, 그리고 천체의 미학
5. 천체의 구경적 의미
[제6장] 박목월 시에서 자연의 의미 변이 과정
1. 목월과 자연
2. 거리화된 자연과 상상의 자연
3. 거리의 좁힘과 일상화된 자연
4. 창조된 자연의 의미
[제7장] 박남수 시에 있어서의 자연의 의미
1. 『문장』과 박남수
2. 자연의 세 가지 층위
3. 순수자연시의 시사적 위치
[제8장] 오규원의 날이미지와 생태학적 상상력
1. 생태론적 위기와 날이미지
2. 날이미지와 생태적 담론의 가능성
3. ‘날 이미지’의 생태론적 가능성과 그 한계
[제9장] 고은 문학과 민주화운동
1. 고은 문학의 위치
2. 시대의 반항아, 그 접점의 세계
3. 민중과 민족의 발견
4. 민족문학의 근거로서의 민중성
[제10장] 오도(悟道)를 향한 영원한 발걸음 -김재홍의 비평세계
1. 시 비평의 체계화 혹은 과학화에 대한 인식
2. 창조 정신과 오도(悟道)의 세계
3. 오도(悟道)- 그 영원한 길을 위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