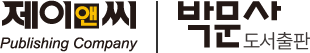도서소개
국어국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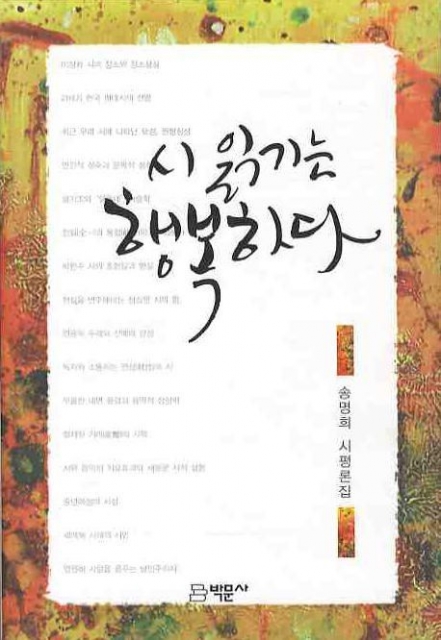
시 읽기는 행복하다
저자 송명희 정가 16000원
상세정보
「이상화 시의 장소와 장소상실」은 이상화에 관한 송 교수의 네 번째의 논문이다. 인문지리학자인 중국의 이-푸 투안과 캐나다의 에드워드 렐프의 현상학적 공간이론을 원용한 이 논문에서 최근 공간이론에 심취하고 있는 송 교수의 학문적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금강송가」, 「도교에서」 등 이상화의 대표작은 모두 장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 송교수의 지적이다. 침실, 들판, 금강산, 도교 등의 장소감, 장소애, 장소정체성, 장소상실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인의 내적 세계 및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견해이다.
「최근 우리 시에 나타난 모성, 원형심상」은 페미니스트 평론가로서 송 교수의 기량이 한껏 드러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칼 융의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시인 신달자, 김정란, 나희덕, 노혜경 등의 시와 남성시인 황지우, 하재봉, 신경림, 고재종 등의 시를 통하여 모성원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창조와 풍요와 다산과 양육의 상징으로서의 모성원리는 남녀 시인 공통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 대모신의 심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필자는 고찰한다.
여성시인의 경우에는 대모적 모성성의 긍정적 측면이 강화된 희생적 모성원형을 빈번히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운명을 지닌 존재로서 ‘동일시’하는 여성시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성시인들은 본능적 모태의식, 의존의식, 적대적 세계에서 지친 영혼의 휴식과 창조적인 리비도를 충전할 ‘대상’으로서 모성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나쳐 때로 퇴행적인 모성 콤플렉스가 나타난다고 고찰한다. 그리고 여성시인의 경우에 찾기 어려운 관능적이고 리비도적인 여성(모성) 이미지는 남성시인의 경우에는 매우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송 교수의 흥미로운 지적이다. 이밖에 탄생 100주년을 맞아 쓴 김광섭론, 성기조, 김상훈, 차한수, 곽문환, 정선기, 박정선, 류선희 시인의 작품론 등을 이 책은 수록하고 있다.
-
제1부
1. 이상화 시의 장소와 장소상실
2. 21세기 한국 현대시의 전망
3. 최근 우리 시에 나타난 모성, 원형심상
4. 인간적 성숙과 문학적 성 - 존재의 고독에서 사랑과 환희의 세계로 - 김광섭의 시
5. 성기조의 ‘달동네’ 사랑학
6. 전일(全一)과 통합(統合)의 시학(詩學) - 김상훈의 시세계
7. 차한수 시의 초현실과 현실
8. 현실을 변주해내는 싱싱한 시의 힘 - 곽문환 제 7시집 "긴 그림자는 바람이 되어"
제2부
1. 연륜의 두께와 신예의 감성 - 정선기․이선형
2. 독자와 소통하는 연성(軟性)의 시 - 박정선
3. 우울한 내면 풍경과 음악적 상상력 - 류선희의 시
4. 절제와 거리(距離)의 시학 - 류수인의 시집 "나 어디로 가나"
5. 시와 음악의 치료효과와 새로운 시적 실험 - 김옥균의 "아침기도"
6. 중년여성의 시심 - 손순이․박옥수
7. 세계화 시대의 시인 - 김철
8. 영원히 사랑을 꿈꾸는 낭만주의자 - 최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