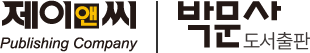도서소개
역사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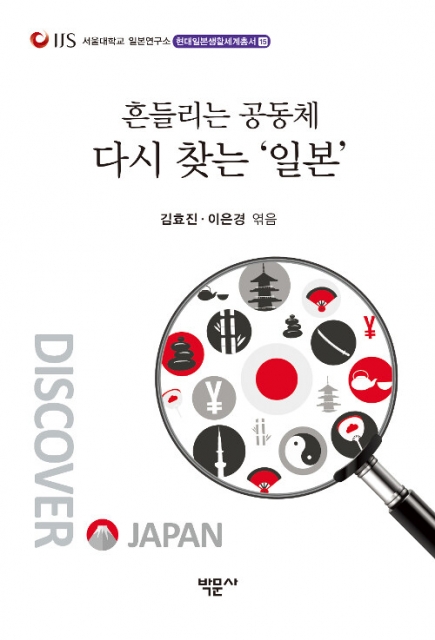
흔들리는 공동체, 다시 찾는 '일본'
저자 김효진, 이은경 정가 24000원
상세정보
본서는 최근의 일본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공동체 경계의 유동화’이다. 다양한 소수자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일본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일본인’, ‘일본문화’ 담론에서 지금까지 제외되어 있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주목이 일어나고, 이들에게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정도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흐름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함께 태동하였다. 한편, 2000년대 일본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흐름은 전영역에 걸친 풀뿌리부터의 ‘보수화,’ 나아가 배외주의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느슨하게 유지되어 오던 ‘전후 일본’이라는 공동체가 포스트전후,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구조적 변동을 거치면서 복지나 권리 등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으로 인해 점차 해체되고 있고, 그 공동체의 경계가 다시 확인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이너리티는 그 경계 안으로 포섭되고 어떤 마이너리티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경계 밖으로 내던져지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대두하는 것이 바로 본서의 두 번째 키워드인 상상된 공동체이자 새로운 공공으로서 ‘일본’의 이미지이다.
이상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그 이전과는 다른, 보다 심대하고 근원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구조적 변동으로 인해 포스트 전후적 일본사회가 해체되면서 ‘일본’, 혹은 상상의 공동체로서 ‘일본’의 이미지에 대한 강조가 다시 이를 통합하기 위한 대체물로 등장하였다는 상황 인식의 토대로, 일본사회에서 최근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공공’이 어떤 모습이며 그것이 어떤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탄생하였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서문/ 현대 일본사회와 새로운 ‘공공’의 탐색
<1부> 제도적 모색
Ⅰ. 동성파트너쉽제도를 통해 본 포섭과 배제의 정치학
1. 일본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동성파트너쉽 제도의 도입
2. 일본의 혼인제도와 동성파트너쉽의 위상
3. 동성파트너쉽 제도를 둘러싼 움직임: 정치권을 중심으로
4. 동성결혼을 둘러싼 페미니즘, 성소수자 내외부의 입장차
5. 성소수자운동과 페미니즘의 연대: 앞으로의 전망
Ⅱ. 지역복지의 공공(公共), 그리고 ‘새로운’ 공공
1. ‘새로운 공공’이라는 화두
2. 공공, 그리고 ‘새로운’ 공공
3. 지역복지의 현장에서 본 ‘공(公)’과 ‘공(共)’
4. 사협은 왜 ‘관’이라고 인식되는가
5. ‘새로운 공공’의 지역적 실천과 그 한계
6.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것”
<2부> 전후 미디어
Ⅲ. NHK월드TV와 ‘일본’ 이미지의 변용
1. ‘외국인’ 대상 텔레비전 국제방송
2. 소프트파워와 국제방송의 담론적 결합
3. 시청자 니즈와 방송 효과라는 신기루
4. 국제 경쟁력과 ‘일본’ 이미지의 변용
5. 일본 사회의 구조 변동과 ‘일본’을 둘러싼 이미지 정치
Ⅳ. 다이쿠(第九) 현상과 일본적 베토벤
1. 일본열도의 베토벤 9번(다이쿠) 열광
2. 일본의 다이쿠 현상
3. 비판적 관점에서 본 베토벤 9번과 다이쿠
4. ‘고통에서 환희로’의 허상
<3부> 타자 인식
Ⅴ. ‘애국여성’의 등장과 ‘반(反)위안부’ 활동
1.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여성
2. 현대 일본의 ‘애국여성’
3. ‘애국여성’의 국제적 ‘반(反)위안부’ 활동
4. ‘애국여성’의 특징과 위안부문제
Ⅵ. 일본 중국사학자의 중국인식과 ‘공동체론’
1. 일본의 ‘중국론’
2. 사회유형론적 중국사관의 부활
3. 중국국가와 사회 격리론: ‘약한 국가’, 혹은 ‘국가 부재론’
4. 인식도구로서의 ‘공동체’ 인식과 중국관
5. ‘공동체라는 인식틀’의 문제점
<4부> 자기 이미지
Ⅶ. 고지라는 왜 일본으로 돌아오는가
1. 고지라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2. 고지라와 ‘망령’
3. 고지라와 자위대
4. 공동체의 침몰
5. 파괴를 소비하는 공동체
6. 나가며: <신 고지라>는 새로운가?
Ⅷ. 3.11 이후, 무라카미 다카시의 변화하는 슈퍼플랫
1. <오백나한도>는 무엇을 초래했는가?
2. 전통과 오타쿠는 어떻게 길항하는가?
3. <오백나한도>에서 <메메메의 해파리>로: ‘이야기’는 성공했는가?
4. 흔들리는 슈퍼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