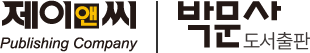도서소개
역사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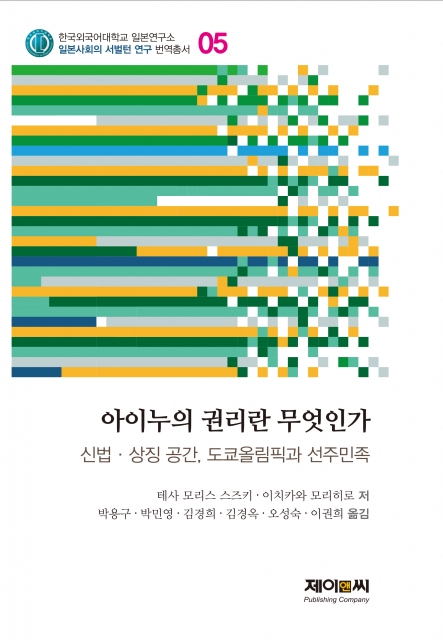
아이누의 권리란 무엇인가 -신법ㆍ상징공간, 도쿄올림픽과 선주민족
저역자 Tessa Morris-Suzuki / 市川守弘 / 박용구 외 역 정가 25000원
상세정보
메이지(明治) 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 에조가시마(蝦夷島)의 마쓰마에번(松前藩) 영토였던 ‘마쓰마에 지역(일본인 지역)’ 북쪽은 아이누 민족이 살아온 대지였다. 아이누는 자신들이 사는 대지를 ‘아이누 모시리(인간의 고요한 대지)’라 부르며 촌락을 거점으로 수렵, 어로를 하면서 다양한 생산활동을 영위하였다. 아이누가 생활하던 마을에는 자신들의 행정권과 사법권이 있었고 아이누 종교를 믿으며 자치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마쓰마에번과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있고 현장 청부업자로부터의 강제 노동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촌락 내에서에는 아이누의 자치권이나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었다. 촌락의 생업 공간인 ‘이오루’에서는 수렵이나 어로, 농경이나 들풀 채취 등이 촌락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아이누의 자유가 남아 있었다.
아이누가 일방적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희생을 강요당한 것은 일본이 근대를 맞이하고 난 후, 메이지 정부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이라는 갓 성립된 국민국가에 에조가시마를 편입하여 홋카이도로 개명한 후 식민지로 삼고 아이누의 호적을 만들어 일본인화를 꾀하였다. 이때부터 아이누 민족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이누가 사용하던 토지를 무주지로 간주하여 몰수하고 수렵권, 어로권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다. 또한, 동화 정책이 강요되면서 아이누 문화는 부전되었고, 일본 본토(内地)에서 이주해 온 대부분의 일본인(와진, 和人)들은 아이누를 차별하여 아이누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없었으며, 차별과 빈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이누는 ‘멸망해 가는 민족’으로 여겨졌고 유골은 호기심 어린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아이누 유골과 부장품의 도굴, 매수, 대학으로의 반입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아시아ㆍ태평양 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아이누 사람들의 긍지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음 해인 2020년에는 ‘민족 공생 상징공간(우포포이)’이 개관된다.
이 책은 일본 북쪽의 원주민이었던 아이누 민족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고난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현대 사회가 본서를 통해 진정한 선주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일본 사회의 아이누 선주권이라는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해 보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
Ⅰ. 〈아이누 신법〉과 일본 정부
<제1장> 연출된 민족 공생
이해를 구하며 아이누는 춤을 춘다
결여된 집단적 권리
정부가 구상한 디자인
실패한 대표의 임명
허공에 뜬 지역의 목소리
계획에 따라다니는 그림자
약탈된 유골의 행방
동의 없는 DNA연구
상징공간을 넘어서
<제2장> 세계의 선주민족과 아이누
유골은 말한다
신중히 듣는다는 것
의견 교환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법률
관광 자원화에 맞서
<제3장> ‘공생의 올림픽’과 선주권
‘함께 노래하자’라는 비전
아이누의 역사와 일본 국가
쟁점이 된 유골
올림픽ㆍ패럴림픽을 넘어
Ⅱ. 선주권과 아이누 민족
<제1장> 아이누의 자랑을 가슴에
i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다
ii 사할린 아이누의 ‘전후’
iii 선주민족으로서 살아가기
<제2장> 아이누 선주권의 본질
UN 선언을 지침으로
행정 시책을 위한 ‘아이누 신법’
유골을 둘러싼 신법의 문제점
‘지역 환원’ 방침의 속임수
아이누 선주권의 주체는 고탄
집단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
어떠한 연어잡이인가?
선주권 논의야말로 필요
‘인간답게 살 권리’의 회복을 위하여-맺음말
<자료>
•관련 연표
•UN 선주민족 권리선언ㆍ국회결의
•아이누 시책 추진법(〈아이누 신법〉)ㆍ부대 결의